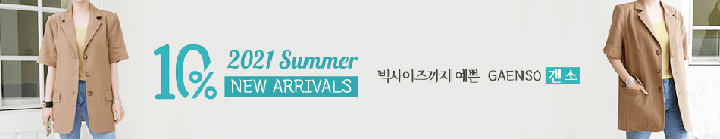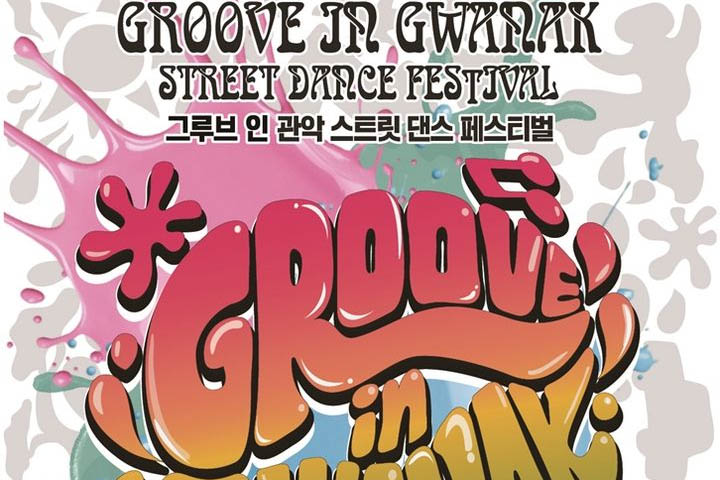한국의 '정년 쇼크'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
 초고령사회로 접어든 한국에서 정년 연장 문제가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정년 65세 시대를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법정 정년 연장과 함께 임금·근로조건 재설계, 맞춤형 정책 지원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초고령사회로 접어든 한국에서 정년 연장 문제가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정년 65세 시대를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법정 정년 연장과 함께 임금·근로조건 재설계, 맞춤형 정책 지원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제언했다.보고서는 정년 연장 논의의 핵심 쟁점으로 네 가지를 꼽았다. 첫째, 법정 정년 연장과 재고용 방식 중 어떤 방식을 택할 것인지, 둘째, 정년과 연금 수급 연령을 어떻게 연계할 것인지, 셋째, 임금과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을 어떻게 결정할 것인지, 넷째, 정년 연장의 경제·사회적 효과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에 관한 문제다.
현행법상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도록 의무화되어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시절 정년을 65세로 연장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세계적으로는 정년이 늘어나거나 폐지되는 추세다. 미국과 영국은 정년제 자체를 폐지했고, 독일은 별도의 정년제 없이 연금 수급 개시 연령(65세에서 67세로 상향)이 사실상 정년으로 기능하고 있다. 일본은 법정 정년 60세를 유지하되 65세까지 재고용을 의무화하고, 70세까지는 기업의 노력 의무로 두고 있다.
그러나 한국의 현실은 녹록지 않다. 법정 정년이 60세임에도 실제로 주된 일자리에서 퇴직하는 평균 나이는 49.4세로, 20년 전 50.0세보다 오히려 0.6세 앞당겨졌다. 권고사직, 명예퇴직, 정리해고 등으로 조기 퇴직하는 사례가 정년 퇴직자보다 빠르게 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중소기업은 임금 부담으로 정년제 운영이 저조한 실정이다.

이에 국회입법조사처는 중소기업 현실을 감안해 고용지원금 확대, 세제 혜택, 임금체계 개편 컨설팅 등 정부의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정년 연장 문제를 두고 노사 간 입장차도 뚜렷하다. 노동계는 법정 정년을 65세로 높이되 연금 수급 연령과의 괴리를 해소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정년 연장에 따른 일방적 임금피크제 도입과 임금 삭감에 반대하며, 청년 고용 위축 문제는 별도의 대책으로 풀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경영계는 획일적인 정년 연장보다는 재고용·계속고용 의무 등 자율적 선택권을 요구하고, 정년 연장 시 성과 중심 임금체계 개편과 노동시장 경직성 해소 등 보완책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현장에서는 정년 65세 시대에 대비한 임금피크제 설계가 최대 난제로 떠오르고 있다. 현행 임금피크제는 '동일노동 동일임금' 논란을 피하기 위해 부서 이동이나 억지 인사 조치를 강요하는 경우가 발생하면서 조직 내 인력 활용과 사기 저하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한 공공기관의 사례처럼, 핵심 인력이 임금피크제 적용 이후 핵심 업무에서 배제되어 조직은 숙련된 인력을 잃고, 당사자는 근로 의욕이 꺾이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더욱이 정년이 65세로 연장될 경우, 기존 임금피크제 구조(정년 3년 전부터 감액 시작)를 그대로 유지하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삭감 기간을 5년 이상으로 늘리면 감액 폭과 보상 조치를 둘러싼 노사 갈등이 불가피하고, 법원도 무효 판단으로 기울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정년 연장에는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고 고령자·청년 고용, 노후소득 보장 체계, 임금·노동조건 등 고려해야 할 요소가 많기 때문에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사회적 대화의 틀을 넘어서는 사회적 대화 시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