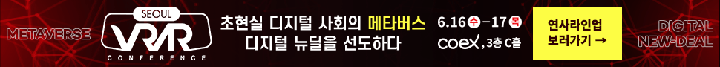총리 목 날아가자 "기회는 지금"…마크롱 퇴진 압박하며 대권 노리는 르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의 정치적 생명줄이 끊어질 위기에 처했다. 극우 세력의 부상을 막겠다며 던졌던 '의회 해산'이라는 치명적인 도박이 결국 부메랑이 되어 돌아와, 1년도 채 안 되는 기간 동안 무려 세 명의 총리를 갈아치우는 전대미문의 정치적 혼란을 야기했다. 이제는 극좌 정당의 대통령 탄핵안 발의까지 예고되며, 마크롱 대통령은 그야말로 사면초가의 위기에 직면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의 정치적 생명줄이 끊어질 위기에 처했다. 극우 세력의 부상을 막겠다며 던졌던 '의회 해산'이라는 치명적인 도박이 결국 부메랑이 되어 돌아와, 1년도 채 안 되는 기간 동안 무려 세 명의 총리를 갈아치우는 전대미문의 정치적 혼란을 야기했다. 이제는 극좌 정당의 대통령 탄핵안 발의까지 예고되며, 마크롱 대통령은 그야말로 사면초가의 위기에 직면했다.프랑스 정국을 뒤흔든 이번 사태의 발단은 8일(현지시간) 하원에서 가결된 프랑수아 바이루 총리 내각에 대한 불신임안이었다. 하원 의원 574명 중 과반을 훌쩍 넘는 364명이 불신임에 표를 던지며, 출범 9개월 만에 바이루 내각은 총사퇴라는 비극적 종말을 맞았다. 아이러니하게도 이 신임 투표는 바이루 총리 스스로가 제안한 것이었다. 눈덩이처럼 불어난 국가부채를 해결하기 위해 66조 원 규모의 고강도 긴축 재정을 밀어붙이려던 그는, 의회의 신임을 얻어 정책 동력을 확보하려 했으나 결과는 정반대였다. 극우 국민연합(RN)과 좌파 연합은 물론, 범여권과 가깝다고 여겨졌던 우파 공화당(LR)의 일부까지 등을 돌리며 마크롱 정부에 대한 프랑스 정치권의 총체적 불신을 드러냈다.
이 모든 혼란의 씨앗은 1년 전 마크롱 대통령이 직접 뿌렸다. 지난해 6월 유럽의회 선거에서 극우 RN에 참패하자, 그는 RN의 세 확산을 저지하겠다며 전격적으로 의회를 해산하고 조기 총선을 강행하는 승부수를 띄웠다. 그러나 이는 최악의 '악수(惡手)'가 되었다. "좌도 우도 아니다"라며 중도를 표방했던 마크롱의 범여권은 다수당 지위를 상실했고, 오히려 극좌와 극우 양 진영의 의석수만 키워주는 결과를 낳았다. 어느 세력도 과반을 점하지 못한 '여소야대' 정국 속에서 마크롱의 정부는 좌우 연합의 협공에 언제든 무너질 수 있는 살얼음판 위에 놓이게 된 것이다.

조기 총선 이후 마크롱의 수난은 예고된 것이나 다름없었다. 총선 1위 좌파 연합의 총리 지명 요구를 묵살하고 우파 출신 미셸 바르니에를 총리로 임명했지만, 그의 내각 역시 긴축 예산안을 처리하려다 야권의 반발에 부딪혀 출범 3개월 만인 지난해 12월 불신임으로 무너졌다. 바르니에는 '5공화국 최단명 총리'라는 불명예를 안았다.
마크롱은 자신의 오랜 정치적 동지인 중도파 바이루를 구원투수로 등판시켰지만, 상황은 더욱 악화됐다. 바이루 총리는 국방비를 제외한 모든 지출 동결, 심지어 공휴일 이틀 폐지라는 초강경 긴축 카드를 꺼내 들며 여론의 거센 반발을 샀다. 그는 신임 투표 직전 "정부를 전복시켜도 냉혹한 현실은 사라지지 않는다"고 호소했지만, GDP의 113%에 달하는 5200조 원의 빚더미보다 당장의 고통 분담을 거부하는 의회의 벽을 넘지 못했다.
이제 공은 다시 마크롱에게 돌아왔지만, 그에게 남은 카드는 거의 없어 보인다. 극우의 마린 르펜은 지지율 1위를 등에 업고 "의회를 해산하라"며 사실상의 정권 교체를 압박하고 있고, 좌파 연합은 "이제 좌파가 통치할 때"라며 총리직을 요구하고 나섰다. 특히 극좌 성향의 '굴복하지않는프랑스(LFI)'는 "문제는 총리가 아니라 대통령"이라며 마크롱 탄핵안 발의를 선언, 그의 퇴진을 정조준했다. 3년 새 네 번째 총리를 임명해야 하는 마크롱이 과연 이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 프랑스 정국은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혼돈의 소용돌이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