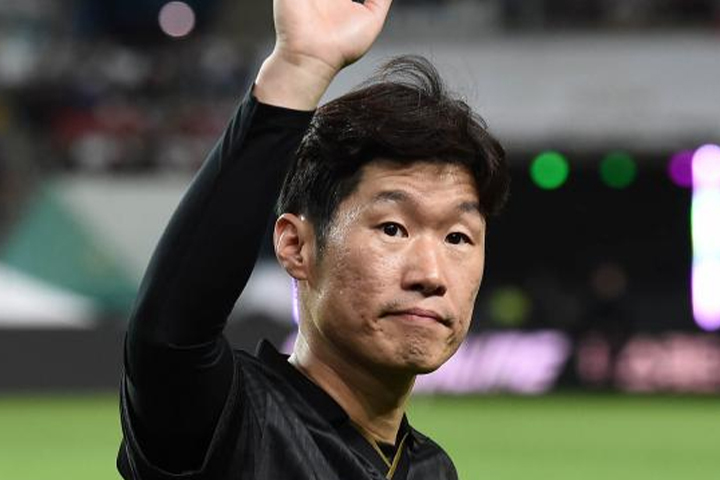삼성전자도 '고작 13% 성장'? 한국 경제, 이대로 가다간 '추락' 경고등!
 대한상공회의소(이하 대한상의)의 충격적인 분석 결과가 대한민국 경제계에 비상이 걸렸음을 알리고 있다. 지난 10년간 중국 기업의 성장 속도가 한국 기업보다 무려 6배 이상 빠르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국내 기업 생태계의 역동성 저하에 대한 심각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미 경제 전문지 포브스가 매년 발표하는 '글로벌 2000' 통계를 기반으로 한 이번 분석은, 한국 경제의 미래를 좌우할 중대한 경고음으로 해석된다.
대한상공회의소(이하 대한상의)의 충격적인 분석 결과가 대한민국 경제계에 비상이 걸렸음을 알리고 있다. 지난 10년간 중국 기업의 성장 속도가 한국 기업보다 무려 6배 이상 빠르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국내 기업 생태계의 역동성 저하에 대한 심각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미 경제 전문지 포브스가 매년 발표하는 '글로벌 2000' 통계를 기반으로 한 이번 분석은, 한국 경제의 미래를 좌우할 중대한 경고음으로 해석된다.23일 대한상의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25년까지 10년간 '글로벌 2000'에 포함된 중국 기업의 수는 180개에서 275개로 52.7%라는 경이로운 증가율을 기록했다. 반면 같은 기간 동안 한국 기업은 66개에서 62개로 오히려 감소하는 퇴보를 보였다. 세계 경제를 주도하는 미국 역시 575개에서 612개로 6.5% 증가하며 꾸준한 성장세를 유지했다. 이 수치는 단순히 기업의 숫자를 넘어, 각국의 경제 활력과 미래 성장 잠재력을 가늠하는 중요한 지표다.
기업 생태계 전체의 매출액 성장률 격차는 더욱 극명한 현실을 드러냈다. 지난 10년간 한국 기업들의 합산 매출액은 1조 5천억 달러에서 1조 7천억 달러로 약 15% 증가하는 데 그쳤다. 이는 저성장 기조에 갇힌 한국 경제의 단면을 여실히 보여준다. 반면 중국 기업들의 합산 매출액은 4조 달러에서 7조 8천억 달러로 무려 95% 폭증했으며, 미국 기업들 또한 11조 9천억 달러에서 19조 5천억 달러로 63%의 견조한 성장을 기록했다. 결과적으로 중국 기업의 성장 속도는 한국의 6.3배에 달하는 압도적인 수치를 기록하며, 한국 경제가 글로벌 경쟁에서 얼마나 뒤처지고 있는지를 냉정하게 보여주고 있다.
국가별 성장을 주도한 기업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이러한 격차의 원인이 더욱 명확해진다. 중국은 알리바바, BYD, 텐센트 등 IT 및 첨단기술 기업들이 성장을 견인했으며, 에너지, 제조업 등 전통 산업 분야에서도 새로운 글로벌 강자들이 끊임없이 등장하며 산업 전반의 혁신을 이끌었다. 특히 중국 최대 온라인 쇼핑몰 기업인 알리바바그룹은 10년간 매출액이 114억 7천7백만 달러에서 1,363억 9천3백만 달러로 무려 1,098%나 폭증하는 기염을 토했다. 미국 역시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등 인공지능(AI) 및 첨단기술 기업들이 혁신의 선두에 섰고, 테슬라, 우버, 에어비앤비와 같은 혁신적인 신생 기업들이 활발하게 시장에 진입하며 역동성을 불어넣었다. 엔비디아는 10년간 매출액이 47억 달러에서 1,305억 달러로 2,787%라는 경이로운 성장률을 기록했으며, 마이크로소프트도 281% 증가했다.

그러나 한국은 달랐다.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와 같은 기존 대기업들과 금융업을 중심으로 성장이 이루어졌을 뿐, 새로운 혁신 기업의 등장은 미미했다. 2025년 '글로벌 1000'에 등재된 한국 기업 62곳 중 상위 10개 기업을 보면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SK하이닉스, KB금융그룹, 기아, 신한금융그룹, 한국전력, 하나금융그룹, 현대모비스, 우리금융그룹으로, 이 중 4곳이 4대 금융지주였다. 심지어 우리나라 기업 중 가장 높은 순위를 차지한 삼성전자조차 10년간 매출액 성장률이 13%에 그치는 것으로 조사되어, 기존 거대 기업들마저 성장 동력을 잃어가고 있음을 시사한다.
대한상의는 이러한 한국 기업 생태계의 문제를 "기업이 성장할수록 지원은 줄고 규제는 늘어나는 역진적 구조"에서 찾았다. 김영주 부산대 교수의 연구 결과는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한다. 12개 주요 법률을 조사한 결과,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면 규제가 94개로 늘어나고, 중견기업이 대기업을 넘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 되면 무려 343개까지 규제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업의 성장을 장려하기보다는 오히려 족쇄를 채우는 결과를 초래하며, 혁신과 도전을 가로막는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종명 대한상의 산업혁신본부장은 "한 해에 중소기업에서 중견으로 올라가는 비중이 0.04%, 중견에서 대기업 되는 비중이 1~2% 정도"라며, "미국이나 중국처럼 다양한 업종에서 무서운 신인기업들이 빠르게 배출되도록 정책 패러다임을 바꿔야 할 때"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대한상의는 한국 기업 생태계에 역동성을 불어넣기 위해, 성장한 기업에 규제가 아닌 보상을 제공하고, 혁신적인 성장형 프로젝트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고 제언했다. 지금처럼 기존 대기업에만 의존하고 새로운 성장을 가로막는 구조를 유지한다면, 한국 경제는 글로벌 경쟁에서 영원히 뒤처질 수 있다는 경고가 현실이 될지도 모른다. 정부와 기업, 그리고 사회 전체가 머리를 맞대고 기업의 성장을 저해하는 역진적 구조를 타파하고, 혁신과 도전을 장려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구축해야 할 시점이다.